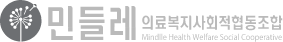-
[기고]처음으로 새해의 바람을 되뇌며
-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mindlle)
- 2025-01-10
- 6522
 |
| 김화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원장 |
지금까지 칼럼에서 주로 의료이용, 병원과 환자, 보건의료체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연의 일치겠으나 2025년 첫 칼럼이기도 하고, 한 해의 시작인 만큼 이번 회차는 아주 사적인 느낌을 전달하고자 한다. 새해가 주는 들뜸으로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12월 31일과 다음 날, 1월 1일의 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왔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새해 첫 일출을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해가 주는 변화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지는 않다.
사소하지만 새해가 되면 환자를 보는 보험적용 규정도 바뀌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변화도 가끔 생긴다. 먼 친척의 자제가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 지인이 발령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나기도 한다. 가까운 사람이 새로운 부서로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꼭 1월 1일을 기점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이 기간에 그런 변화를 더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필자도 연말연시의 변화에 아주 둔감하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올 한 해만큼은 묵은 작년의 달력을 치우고, 새로운 달력을 벽에 걸듯이, 큰 단절을 기대해 본다. 어떤 입장이든, 현재 대한민국은 소용돌이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불안감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느낄 것이다. 사실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지 않는 곳은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포 단위 변화에서 시작하여, 세포의 소멸로 끝나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다. 그러니 인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사회가 아무런 변화 없이 머물러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작년은 유독 그것이 심했다. 너무 파동이 심하고, 울렁거림이 커서 많은 이들은 멀미를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요동을 만들어 내고, 그로 인해 약간의 현기증과 어지러움을 느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참사로 인한 슬픔마저 스며들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새해 인사를 주고받던 지인들 중 일부는 마치 꿈처럼 몽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하고, 감각적으로 아주 예민한 분들은 우울감을 떨쳐내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바람을 적어본다. 2024년과 2025년에 거대한 시간의 단절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이다. 단절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나 적어도 지금의 시공간에서는 그 반대로 보인다. 그래서 속으로 새해의 카운트다운에 맞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외침을 몇 번 되뇌었다.
"2024년 잘 가! 다시 오지 마."
동시에 읽으시는 모든 독자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상투적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너무 익숙해진, 아니 어쩌면 지겨운 이 문장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새해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시기는 이런 상투적인 인사가 그리워지는 계절인지도 모르겠다.
김화준 원장/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출처 중도일보(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107010001227)